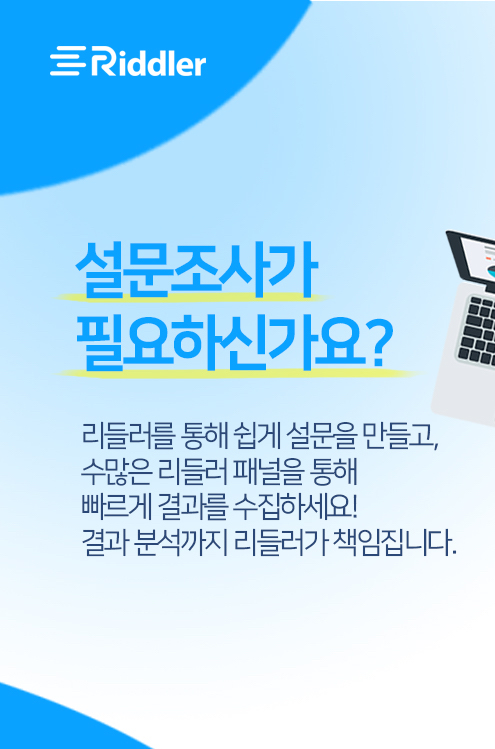[영화 속 건강읽기-9]영화 ‘잠수종과 나비’
사람들은 보통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곤 한다. 그래서 크게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.
여기 한 남자가 있다. 돈과 명예, 사랑과 우정까지,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는 남자다.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된다.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왼쪽 눈 하나뿐이다. 알파벳을 하나씩 읊으면 해당 알파벳에 눈을 깜박여 겨우 소통할 수 있다. 그런 그가 무려 1년 3개월 동안 20만 번 이상 눈을 깜박여 탄생시킨 소설이 ‘잠수종과 나비’다.
의식 있지만, 움직이거나 말하지는 못해
영화 ‘잠수종과 나비’는 프랑스 패션잡지 엘르의 편집장인 장 도미니크 보비(마티유 아말릭)의 자전적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다.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온몸이 마비되는 ‘락트 인 증후군’(locked in syndrome)에 걸렸다. 환자가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관상 혼수상태로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, 혼수상태와 달리 ‘락트 인 증후군’에서는 각성이 유지되어 있고 단지 운동기능만 차단되어 있다. 그래서 보비는 잠수복에 갇혀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잠수종에 비유한다.
뇌의 연수 부위 손상으로 발생
사고로 인한 뇌손상, 순환계질환, 신경세포의 손상, 색전이나 혈전에 의해 기저 동맥이 막히거나 출혈이 되어 연수에 병변이 생기는 경우 발병할 수 있다. 교뇌의 뇌경색으로 발병하기도 한다.
뇌간(숨뇌, 뇌줄기)은 척수와 대뇌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뇌에서 나오는 운동신경을 척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. 운동신경은 뇌간 중 다리뇌(교뇌)에서 가장 앞쪽을 지나가는데, 이 부분에서 양쪽 운동신경이 모두 손상을 받으면 얼굴을 포함하여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. 그러나 이 경우 중간뇌(중뇌)는 손상되지 않으면 눈을 뜨거나 수직 방향으로 안구를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다. 그래서 일부 환자들은 영화 속 보비와 같이 눈을 뜨고 감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했다는 보고가 있다.
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
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도 없고, 말도 할 수 없다면…. 보비는 자신의 얼굴에 파리가 앉아도 쫓을 수도 없다. 일요일 텅빈 병원,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, TV 채널조차 돌릴 수 없어 재미있는 방송이 나올 때까지 지루한 화면을 지켜봐야 한다. 그렇게 보비는 삶의 욕망들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자신을 발견한다.
그러던 중 보비의 담당하는 언어 치료사 앙리에트는 자주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 글자를 배열한 차트를 장 도미니크 보비에게 소개했다. 앙리에트는 보비에게 원하는 글자가 나올 때 눈을 깜박이게 했다. 보비는 그렇게 다시 천천히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. 그리고 그가 눈꺼풀을 움직여 전달한 메시지가 ‘죽고 싶다’에서 사람과 세상에 대해 ‘고맙다’는 감정으로 변화하게 된다.
최근에는 fMRI를 이용, 환자의 뇌 활동영역을 스캔하여 뇌 반응을 통해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, 뇌파를 이용하여 자판을 치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. ‘락트 인 증후군’도 조기치료 여부에 따라 운동능력을 회복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.
원인을 파악해 신속히 치료해야
‘락트 인 증후군’은 원인을 신속히 확인하고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. 뇌경색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. 이런 경우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혈전용해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. 하지만 대부분의 ‘락트 인 증후군’ 생존자들의 만성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남는다. 병상에 장기간 누어서 생활하게 되므로, 욕창, 근육이나 관절의 구축, 감염이나 전해질 불균형 등을 예방, 치료해야 한다.
영화는 보비의 시선으로 더디고 더디게 진행된다. 그래서 자칫 지루할 수 있지만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우울한 절망에서 ‘그래도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?’라는 절대 명제를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다.